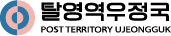참여작가: 김푸르나, 라오미, 이군, 이치리, 정지필, 황호빈
글: 김보현(정림건축문화재단 팀장)
이영일(연변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번역: 황호빈
디자인: 리니어콜렉티브
기획: 라오미
협력: 탈영역우정국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사업
Artists :
Kim Pureuna
Rhaomi 羅吳美
Li Jun 李君
Each Lee 李致理
Jung Jipil 鄭址必
Huang Haobin 黃豪斌
Text: Kim Bohyun 金寶賢 (Junglim Foundation)
Lee youngil 李永日 (Yanbian University)
Translation: Huang Haobin 黃豪斌
Design: Linear Collective
Curated by: Rhaomi 羅吳美
Cooperation: Post Territory Ujeongguk
Supporters: Arts Council Korea
사라져가는 것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 유년 시절을 담은 옛 주택을 개발 단지에 묶여 철거되기 직전에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우연이었다. 녹슨 대문에 빨간 엑스 자가 커다랗게 그어져 있는 모습을 마주했던 것이나 곧 사라질 동네 한복판에 살아움직이는 것이라곤 나 한 명 밖에 없다는 당혹스러움이나 하는 것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다.
문제는 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의 설화처럼 이야기로 남겨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다. 고장 난 라디오와 전축을 고쳐야 하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 덕분에 전국 방방곡곡을 옮겨 다닌 나에게 ‘사라지는 것’은 으레 ‘이동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기록할 만한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빨간 엑스 자가 커다랗게 그어져있는 옛집의 대문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감정은 ‘사라지는 것’을 눈앞에 목도한 최초의 경험인 셈이다.
여기 ‘사라지는 것’을 부여잡는 작품들이 있다. 하나는 양키시장에서, 하나는 대림시장에서 묶여있던 사연이라던가 혹은 되살려보려 애쓰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 전시를 기획한 또 하나의 작가는 멀리 접경 지역의 사라져간 얼굴을 화폭에 담고 흐르는 시간성을 표현한다. 어떤 작가는 균일한 풍경 속에 ‘적응’과 ‘진화’라는 간단한 개요로 설명되는 개체를 전시 공간 안에 불러들이며, 또 다른 작가는 사라진 것에 대하여 나지막한 질문을 던지는 사진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 모든 시도와 작업들은 어찌 보면 행동 양식(movement)이라 부름직한데, 예술가들을 관통하는 주제의식과 태도가 계속해서 어떤 삶의 무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 정지필은 인천의 양키시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양키시장에서 판매하는 알록달록한 사탕들을 가지고 작가는 술을 빚었다. 술을 빚고 그것을 관람객과 나눠 먹는 행위에서 삶 이전의 기억을 공유해 보는 것으로 전하는 작가의 진심은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시작되어 전시장 깊은 곳까지 흘러들고 있다.
흐르는 시간에서 잡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는 행위는 작가 황호빈의 작품 속에서도 드러나는데, 조선족이라 쉽게 타자화되는 ‘그들’이 사는 대림동의 이야기를 거꾸로 파헤쳐 본다. 대림동으로 이주한 노인이 전해주는 음식의 레시피를 받아 적으며, 그 음식을 실제로 완성한다. 이는 시대의 변천, 역사의 흐름과 같은 거대한 시류 속에서 잠겨 들어갔던 개인의 미시적 기억을 현재에 다시 끄집어내어 집단과 개인의 틈을 불러 모으는 어떤 시도인 셈이다.
작가 김푸르나의 작품에서도 거대 담론과 미시적 사연들의 틈 사이의 생명과 신체를 더욱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첨단 미래도시’라 자칭하는 어느 지역의 균일한 컬러칩 안에서 과거에 살았거나 혹은 지금도 스러져가는 생명들의 흔적을 ‘패턴’으로 만나본다. 도심 속 사소한 무늬를 기록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새의 이름을 추억하며 그의 부리를 채색하기도 하는 예술가들은, 선인지 면인지 심지어 공(空)인지 알 수 없는 그림자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 전시를 기획한 라오미 작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수집해왔다. 각 작가들의 이야기를 전시장 안에 수집하는 것이 하나의 결이라면, 작가 본인의 화폭에서는 접경 지역에서 흘러들고 또는 맴돌았던 이야기, 민화, 또는 사진, 이미지를 모아 마치 셰헤라자드의 이야기보따리처럼 다양한 서사의 협곡을 채우는 또 하나의 결인 셈이다. 또한 절제된 색감 속에서 더욱 강조하는 것은 휘몰아치는 물결 속에서 잠영하고 다시 수면 위에 드러나는 전설이 된 ‘그들’의 얼굴이다.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진 속에서 배제된 채 참담한 설화나 환상 동화 정도로 치부되었던 과거의 시간이 라오미 회화 안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물장구를 치며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이번 <River of shadows> 전시장은 각 작품에서 범람하는 시간성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해안가에 가닿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과거에 맴돌고 있거나, 오직 현재로서만 존재하여 잊혀진 시간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시도들은 각기 다른 해안가, 경계지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맴돌고, 다시 사라지는 조류(潮流)는 이제 훈춘의 사진 작가 이군에게도 가닿는다.
무언가가 사라지고 그 기능을 잃은 것만 같은 풍경을 담아내는 이군 작가의 사진은 물성을 짐작하는 것을 넘어, 짐작 그 이상의 물컹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사라지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도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Solid melts into air> 연작 중 멈춰진 연회장이라던가, 쭉 뻗은 지평선의 이미지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의 후희 또한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라져가는 것을 부여잡고, 혹은 어떤 이야기로 남긴다는 것. 그 시도는 미술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어떤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큐레이터로 분해온 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언어이다. 하지만 이번 <River of shadows;潛影流江>을 통해 나 역시,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경험”을 드디어 하나의 이야기로 남겨본다. 작은 서문이지만 이렇게라도 남겨보고 부여잡는 것이 이번 전시의 커다란 움직임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 믿으며.
River of shadows 전시서문 중 발췌 (글 : 김보현)